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오셀로 역을 맡은 배우. 공연이 거듭될수록 그는 진짜로 오셀로가 되면서 자신의 삶을 잃어간다. 급기야 오셀로처럼 질투에 미쳐, 새로 사귀게 된 한 여인을 살해하고 마지막 무대에서 오셀로처럼 목숨을 끊는다. 조지 쿠커의 영화 <이중인생>(A Double Life)의 줄거리이다. 이 영화로 로널드 콜먼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미클로시 로자가 극음악 작곡상을 받았다.
이 영화의 제목은 뒷날 로자의 자서전 제목으로 쓰인다. ‘상업적’인 영화음악과 ‘순수’ 음악 사이를 오간 예술가의 삶을 이처럼 잘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 다행히 영화에서와 달리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로자는, 비록 두 세계를 상호의존적이지 않게 독립적으로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쪽에 매몰되어 다른 쪽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두 인생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을 잃지 않으며 궁극적인 통합을 이루어 냈다.
생애
미클로시 로자(Miklos Rozsa)는 1907년 4월 16일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다.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운 미클로시는 아버지 소유의 농장에 머물면서 농민들이 부르는 민요를 자주 접하였다. 그때 들었던 민요 체험이 평생 동안 그의 음악 창작에 중요한 원천(源泉)이 된다. 고등학교 재학 중 리스트 협회 회장으로 뽑힌 미클로시는, 당시 헝가리에서 진보적이고 논쟁적인 작곡가였던 바르토크와 코다이의 음악을 지지하는 활동으로 보수적인 부다페스트 음악계와 충돌하기도 한다.
사업을 이어주기 바라던 부친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클로시는 라이프치히 음악원에 들어가 레거의 제자인 신고전주의자 헤르만 그라브너(Herman Grabner)로부터 배웠다. 형식과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때 형성된 듯하다. 1929년 우등으로 졸업하기 전에 이미 그의 현악 삼중주, 작품 1이 유명한 악보출판사 브라이트 운트 해르텔(Breitkopf & Hartel)에서 출판되었고, 이 관계는 평생 지속된다.

1931년 파리로 온 로자는, 생계를 위하여 닉 토메이를 비롯한 가명을 몇 개 써가며 돈되는 폭스트롯 같은 당대 대중음악을 작곡하면서도, 클래식 작곡가로서 차츰 명성을 쌓아갔다. 특히 1934년 초연된 관현악곡 주제,변주와 피날레, 작품 13은 그에게 국제적 명성을 안겨주었다. 같은해 아르투르 오네게르(Arthur Honnegger)와 합동으로 창작곡 연주회를 연 로자는 기대와는 달리 형편없는 수입에 실망한다. 작곡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진지한 질문에 오네게르가 준 답은 영화음악이었다. "당신같은 사람도 폭스트롯을 씁니까?"라고 놀란 로자에게 오네게르는 영화음악의 예술적 가능성을 말해주었다. 오네게르가 작곡한 <레 미제라블>은 로자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그러나 영화음악을 작곡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세상사가 늘 그렇듯이 경력자 우대라는 관행 때문이었다.
기회는 런던에서 왔다. 로자의 발레음악 ‘헝가리아’를 듣게 된 런던 필름의 자크 페이더가 <갑옷없는 기사>(1937)의 음악을 맡긴 것. 러시아를 무대로 한 연애모험극인 이 첫 작품부터 강렬하고 극적이면서도 민요적 특성을 살려내는 로자의 개성이 분출하고 있다. 그 뒤 로자는 런던 필름의 전속 작곡가로 활약하면서 영화음악계에서도 명성을 쌓아갔다.
1938년 바덴바덴 음악제에서는 로자의 ‘3개의 헝가리 영상’이 성공적으로 초연되었다. 로자는 1937년과 1938년 연달아 헝가리 최고 권위인 프란츠 요제프 작곡상을 수상하였다.

제2차 대전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다. 공습으로 인하여 런던에서는 더 진행하기 힘들어진 영화의 후반 작업을 위하여 <바그다드의 도둑> 제작진과 함께 작곡을 맡은 로자는 1940년 캘리포니아에 도착한다. 제작진이 대거 할리우드로 넘어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바로 미국의 참전을 독려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여하튼 로자는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정주하기로 결심한다. 뒤이어 작곡된 <정글북>은 미국영화음악 최초의 상업 음반으로 발매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그 전설적 음반이 The Film Music of Mikls Rzsa. FLAPPER PAST CD 7093으로 나와 있다). 이 시기에 로자는 동양의 신비를 다룬 영화의 음악을 많이 작곡하였다.
그 뒤 미국의 전쟁 참여를 독촉하는 메시지를 담은 <레이디 해밀턴>(Lady Hamilton or That Hamilton Woman. 뒤의 노골적 제목이 미국판에서 사용되었다)이 제작된다. 비비언 리가 로렌스 올리비에가 연기한 넬슨 제독의 연인 역으로 나온 이 영화에서 로자는 아주 품위있고 그리움에 가득찬 감미로운 사랑의 테마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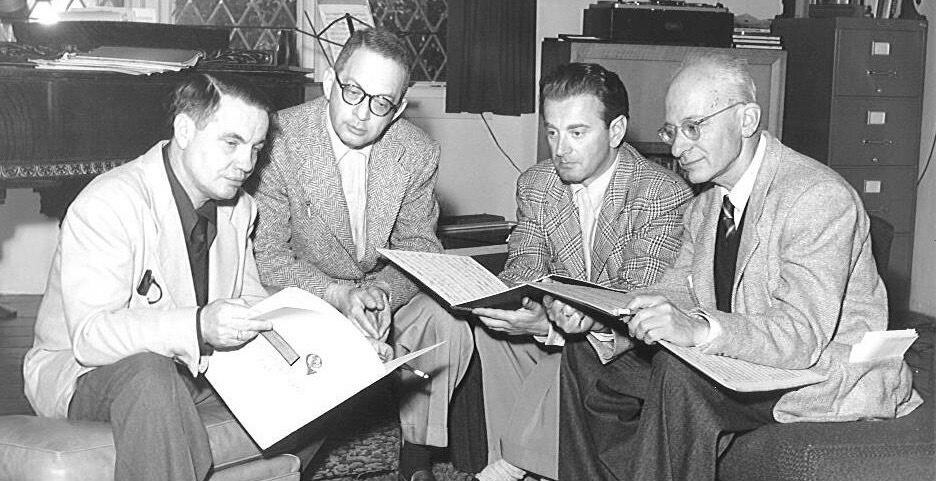
할리우드는 마치 로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무대와 같았다. 히치콕의 <스펠바운드>, 빌리 와일더의 <잃어버린 주말>, <붉은 집>과 같은 심리물, 40년대 중후반에 작곡된 <살인자들>, 다시 빌리 와일더의 <이중배상>, <아스팔트 정글>, <벌거벗은 도시>, <폭력>등의 필름 느와르 음악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어둡고 강렬한 화성과 리듬, 대담하고 독특한 민속적 특징이 현대 암흑도시의 분위기와 어울려 관객들을 열광시켰고, 헐리웃에서 그의 명성은 확고해졌다.

MGM 영화사에 전속되어 있던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는 <마담 보바리>를 필두로 하여 <쿼바디스>, <아이반호>, <줄리어스 시저>, <불꽃의 사람 고흐>, 윌리엄 와일러의 <벤허>, 니컬라스 레이의 <왕중왕>, 앤소니 만의 <엘시드>, 로버트 앨드리치의 실패작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서사극을 위한 걸작 영화음악들이 주로 작곡되었다. 로자는 서사극 음악에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맞는 정격성을 도입하여 현대적인 드라마 감각과 완벽히 결합시켜 장르의 음악 스타일을 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음악 작곡가로서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에도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야샤 하이페츠를 위한 위대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비롯하여 현악협주곡, 연주회용 서곡, 레너드 페나리오를 위한 피아노 소나타 등등의 주옥같은 걸작이 작곡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영화계에 불어온 팝음악의 열풍으로 심포닉한 영화음악은 퇴조한다. <The V.I.P.s>(우리말 개봉제목은 '예기치 못한 일')를 작곡한 후부터 로자는 갑자기 인기없는 구식 영화음악 작곡가가 되었다. 세상이 달라졌고, 사극 열풍도 시들기 시작하였다. 현대영화에서 로자의 표현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아니, 그가 확립한 스타일이 클리셰가 되어 구식 할리우드 영화음악을 상징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절정기와 퇴조기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극적으로 교차하는 드문 경우를 로자는 맞이하였다. 이것은 그의 작품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시대의 변화가 원인. 그러나 세상일에 나쁘기만 한 것이 어디 있을까. 불행 중 다행이랄까. 영화음악 활동에 공백이 생긴 동안에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레너드 페나리오를 위하여 피아노 협주곡, 야노스 슈타커를 위하여 첼로 협주곡 등의 걸작이 연달아 작곡되었으니 말이다.

쳄발롬을 매력적으로 구사한 <파워>에서 오랜만에 로자의 변함없는 실력을 보게 된다. 대단히 압도적인 관현악 전재로 영상의 한계를 훌쩍 뛰어 넘는다. 1970년대에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주테마로 사용한 <셜록 홈즈의 사생활>를 비롯하여 <프로비던스>, <타임 애프터 타임>, <바늘구멍>등의 영화음악이 작곡되었다. 특히 <프로비던스>는 프랑스의 오스카라고 할 수 있는 세자르 음악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니콜라스 메이어의 ,<타임 애프터 타임.>은 로자의 후반기 영화음악 중 걸작으로 꼽힐만큼 훌륭한 음악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두 개의 관현악 작품인 트리파르티타(Tripartita)와 걸작 중의 걸작인 비올라 협주곡, 대단히 짜임새가 훌룡한 현악사중주 제2번이 작곡되었다.
1982년 <죽은 자는 체크 무늬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스티브 마틴의 느와르 패러디 코미디에서 자신의 40년대 느와르 음악의 클리셰를 맘껏 표현한 상징적인 작업을 끝으로 뇌졸증 등 건강이 악화되어 영화음악에서 은퇴하였다. 이후에도 1988년까지 로자는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이올린, 기타, 옹드 마르티노 등을 위한 무반주 기악곡들을 작곡하였다. 비올라 독주를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로자는 90여편에 이르는 영화음악과 작품번호 45에 이르는 콘서트 음악을 작곡하였고, <스펠바운드>, <이중생활>, <벤허>로 아카데미상을 3회 수상하였다. 1945년부터 20여 년 동안은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스펠바운드>를 보고 영화음악에 빠져 들기 시작하였다는 제리 골드스미스가 그의 제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이다.
미클로시 로자는 1995년 7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음악세계
로자는 영화의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청중을 인도한다. 예수가 앉은뱅이 소년을 고치는 기적 장면(<왕중왕>)에는 아무 대사도 없다. 이 장면을 기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오로지 음악의 힘. <벤허>의 여러 장면들은 로자의 음악으로 인하여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는다.

히치콕의 <스펠바운드>(피아노 협주곡으로 개작된 Spellbound Concerto는 스티븐 휴, 존 모체리/ 헐리웃 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Hollywood Nightmares. PHILIPS 442 425 2 음반이 가장 훌륭하다)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이 그레고리 펙에 대한 연정에 불타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계단을 올라 서재에 들어가는 평범한 장면은 두터운 현악기군이 주도하는 도취적이고 낭만적인 선율로 인하여 관객들의 넋을 빼놓을만큼 매혹적인 장면으로 탈바꿈한다.

무도회장에서 점차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미묘한 여성 심리의 변화를 점층적인 클라이막스를 쌓아가며 표현한 ‘마담 보바리 왈츠’의 황홀경은 또 얼마나 눈물날 정도로 감동적인가(존 모체리가 지휘한 할리우드 볼 오케스트라의 The Great Waltz. PHILIPS 438 685 2 음반에 담긴 마담 보바리 왈츠의 연주는 곡의 핵심을 궤뚫은 명연으로 이 곡 하나를 위해서 이 음반을 구입해도 될 정도!).
<벌거벗은 도시>의 추적 장면에서는 성부(聲部) 사이의 추적을 기본으로 하는 음악형식인 푸가의 예술과 영화의 추격 드라마가 행복하게 결합한다. 잘 알다시피 푸가는 하나의 성부를 다른 성부가 ‘추적’한다. 그 ‘추적’의 음악을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추적’에 적용하였으니 이야말로 음악과 드라마의 완벽한 결합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형식적인 추적 음악이 아니라 쫓고 쫓기는 사람의 긴장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내 마지막 순간에 감정을 연소시키는 독자적 음악으로도 기능하니 더욱 더 놀랍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로자 영화음악이 세대를 뛰어넘어 긴 생명력을 갖는 이유이다. 영화 장면들을 떠나더라도 로자의 영화음악은 고전적 구성원리에 충실하게 주제를 발전시켜 가기 때문에 독립된 관현악곡으로 듣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것.

로자의 ‘비(非)영화’ 음악, 즉 연주회 음악은 단순히 말하자면 신고전주의적인 형식미와 짙은 헝가리 색의 낭만적 정열이 결합되어 있다. 특히 바이올린, 바이올린과 첼로, 첼로, 피아노, 비올라 등을 위한 5개의 협주곡은 불꽃 튀는 정열과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가 정교한 구성 속에 녹아든 걸작들로 한 곡 한 곡 모두 그 분야의 최고걸작이라고 할만하다. 그밖에 3개의 헝가리 영상, 현악협주곡, 연주회용 서곡, 트리 파르티타, 양조장집 딸(The Vintner's Daughter), 주제,변주와 피날레, 헝가리 야상곡, 헝가리 세레나데 등의 관현악곡, 두 편의 현악 4중주, 피아노 소나타,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등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음악을 바르토크나 코다이의 아류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헝가리 농민요를 공유하느라 생긴 유사성을 착각한 오해이다. 로자의 음악은 다른 누구와도 구별되는 그만의 어법이 있고 듣는 즉시 로자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개성적이다.
조성음악의 역사가 쌓아올린 다양한 기법과 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삶의 열정과 에너지야말로 로자 음악의 진정한 매력일 것이다.
“나는 음악이 의사소통의 한 형식이라고 믿는다. 내게 음악은 지능 혹은 두뇌회전을 위한 낱말맞추기 퍼즐이라기보다는 감정의 표현이다. 토마스 비첨 경처럼 나도, 삶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는 삶의 긍지를 일깨우지 않는 음악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전통주의자이다. 나는 아름다움이라는 요소 없이는 그 어떤 예술도 가치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구식인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나의 작품 속에서 인간 감정들을 표현하고 인간의 가치를 역설하려고 시도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조성체계의 틀을 벗어날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다. 조성은 라인(line)을 의미한다. 라인은 멜로디를 뜻한다. 멜로디란 노래다. 노래, 특히 민요는 음악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민요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원초적인 인간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중인생 : 미클로시 로자 자서전』에서)
'Miklós Róz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로자(Miklós Rózsa) : 엘 시드(EL CID) (0) | 2008.05.23 |
|---|---|
| 퀸트(Quint)와 키트루크(Khitruk)가 연주하는 미클로시 로자(Miklós Rózsa) (0) | 2007.10.07 |
| 로자(Miklós Rózsa) : 현악협주곡, 작품 17 (0) | 2007.08.30 |
| 미클로시 로자 탄생 100주년 (0) | 2007.07.27 |
| 미클로시 로자(Miklós Rózsa) : 바그다드의 도둑(The Thief of Bagdad) (0) | 2007.06.29 |






댓글 영역